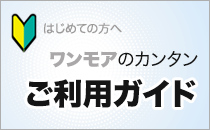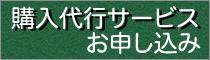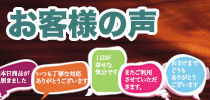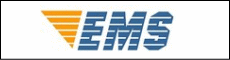今日の為替レート
お振込銀行
クレジットカード支払い
ログイン | LOGIN
商品カテゴリー
- ブランドファッション
- ファッション/雑貨
- ビューティー
- 食品
- 出産/育児
- 生活雑貨
- パソコン
- レジャー
조선무속고 역사로 본 한국 무속 - 서남동양학자료총서 양장)
|
|||||||||||||||||
| 商品購入についてのご案内 | |||
|
|||

책소개
역사로 본 한국 무속『조선무속고』. 조선시대 고종 때 태어나 한국의 종교와 민속 연구에 개척적인 업적을 남긴 이능화 선생의「조선무속고」를 역주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 무속의 역사와 제도, 의식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무(巫)에 대한 비교연구까지 담고 있다.
이능화의「조선무속고」는 한국의 무속, 특히 무속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자료이다. 이 자료는 한국 무속에 관한 125종에 달하는 방대한 고(古)자료들을 발췌, 정리했을 뿐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는 현지조사, 지역별 무속의 정리와 중국, 일본의 무속과의 비교연구까지 수행한다.
특히 고대 이후의 자료를 시대별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한국 무속에 대한 자료집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넘어 각종 무속 관련 자료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까지 그 의미를 넓힐 수 있다. 또한 관련 풍습 등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해 당시 선조들이 행하던 한국 무속의 실상을 살필 수 있다.
이능화의「조선무속고」는 한국의 무속, 특히 무속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자료이다. 이 자료는 한국 무속에 관한 125종에 달하는 방대한 고(古)자료들을 발췌, 정리했을 뿐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는 현지조사, 지역별 무속의 정리와 중국, 일본의 무속과의 비교연구까지 수행한다.
특히 고대 이후의 자료를 시대별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한국 무속에 대한 자료집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넘어 각종 무속 관련 자료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까지 그 의미를 넓힐 수 있다. 또한 관련 풍습 등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해 당시 선조들이 행하던 한국 무속의 실상을 살필 수 있다.
목차
서남동양학자료총서 간행서
책머리에
일러두기
해제
제1부 "조선무속고"역주
제1장 조선 무속의 유래
제2장 고구려의 무속
제3장 백제의 무속
제4장 신라의 무속
제5장 고려시대의 무속
제6장 조선시?대의 무속
제7장 궁중에서도 무당을 좋아함
제8장 무격이 소속된 관서
제9장 무업세와 신포세
제10장 무병제도
제11장 요망한 무당과 음사를 금하다
제12장 무당을 도성 밖으로 쫓아내다
제13장 무격의 술법
제14장 무고
제15장 무축의 용어와 의식
제16장 무당이 행하는 신사의 명칭
제17장 성황
제18장 서울의 무풍과 신사
제19장 지방의 무풍과 신사
제20장 부록: 중국 무속사의 대략
제2부 "조선무속고" 원문 교감
第一章 朝鮮巫俗之由來
第二章 高句麗巫俗
第三章 百濟巫俗
第四章 新羅巫俗
第五章 高麗巫俗
第六章 李朝巫俗
第七章 宮中好巫
第八章 巫覡所屬之官署
第九章 巫業稅及神布稅
第十章 巫兵之制
第十一章 禁妖巫及淫祀
第十二章 黜巫城外
第十三章 巫覡術法
第十四章 巫蠱
第十五章 巫祝之辭及儀式
第十六章 巫行神事名目
第十七章 城隍
第十八章 京城巫風及神詞
第十九章 地方巫風及神詞
第二十章 支那巫史大略
찾아보기
출판사서평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한국 무속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능화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의 완역주석본이 출간됐다. 한국 무속의 역사와 제도, 의식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무(巫)에 대한 비교연구까지 수행한 그의 저작은 한국의 무속사와 종교사 그리고 사회문화사 연구의 선구적 업적이자 한국문화의 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수년에 걸쳐 원문을 꼼꼼히 교감(矯監)한 역주자의 노력으로 탄생한 이번 완역주석본은 「조선무속고」의 유일한 정판본으로 꼽기에 충분하다.
한국 무속에 관한 본격 연구서
예부터 우리 생활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귀신을 섬기는 역할을 하던 무(巫)는 두려움과 존경의 이중적 대상이었다. 유학(儒學)의 전래로 고려중기 이후 줄곧 천시와 배척을 당하던 한국 무속의 역사와 실상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조선후기에 선교사와 국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의 무속을 샤머니즘의 일종으로 주목한 19세기말의 선교사들은 그 논의의 목적이 선교에 제한된 것이었고, 신채호·박은식·최남선 같은 국학 연구자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무속을 ‘신교(神敎)’와 ‘선교(仙敎)’ 등의 상이한 표현으로 일컬으며 한국의 고유종교로서 관심을 표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1927년 잡지 『계명(啓明)』에 발표된 이능화의 「조선무속고」는 한국 무속에 관한 무려 125종에 달하는 방대한 고(古)자료들을 발췌·정리했을 뿐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는 현지조사, 지역별 무속의 정리와 중국, 일본의 무속과의 비교연구까지 수행하여 한국 무속에 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로서 모습을 갖췄다.
역사·풍습·언어로 살펴보는 한국의 무속
「조선무속고」는 고대 이후의 자료를 시대별로 정리했다는 면에서 일차적으로 한국 무속에 대한 자료집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자료의 단순한 정리를 넘어, 각종 무속 관련 자료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또한 이능화는 무속을 배척하던 당대의 지배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매몰되기보다 한국의 무속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고증하면서 무속현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려는 학문적 의지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무풍과 신사’(19장)를 별도의 장으로 두어 지역별 무속을 정리했으며, 천연두에 걸렸을 때 행하는 굿의 절차(295면)나 출가하지 못하고 죽은 여자 귀신인 손각씨(孫閣氏) 관련 풍습(328면) 등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해 당시 선조들이 행하던 한국 무속의 실상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무속의 본질과 실체를 밝히는 데 한자와 우리말에 기초한 언어풀이 방식을 시도한 점 또한 독특하다. 가령 이능화는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하늘에 제사 지내는 설단제천(設壇祭天)에서 단군(壇君)이란 단어가 비롯됐다고 해석하며(93면), ‘궂은날’ ‘궂진일’로 활용되는 우리말의 용례에서 ‘굿’이란 용어가 ‘흉하다’는 의미(282면)를 지니게 되었다고 풀이한다.
꼼꼼한 원문 교감(矯監)을 거친 완역주석본
한·중·일의 무수한 자료를 섭렵하여 발췌·정리한 이능화의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조선무속고」 원본에는 원자료와 다른 오자(誤字)가 상당수 발견되거나 인용자료의 책명이 틀린 경우, 무관한 자료의 제시 등의 오류가 존재했었다. 기존에 출간된 완역본과 여러권의 부분 번역본들은 모두 이 잘못된 원문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역주자는 수년간 강의를 거치면서 원문을 꼼꼼히 대조하며 오자를 바로잡았고, 미확인된 자료를 재차 찾아 확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번역과 주석을 덧붙여 출간된 이번 완역주석본은 「조선무속고」의 유일한 정판본이라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 책은 우리 동아시아 담론의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취지로 서남학술재단에서 지원하는 서남동양학자료총서 시리즈로 간행되었다.
한국 무속에 관한 본격 연구서
예부터 우리 생활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귀신을 섬기는 역할을 하던 무(巫)는 두려움과 존경의 이중적 대상이었다. 유학(儒學)의 전래로 고려중기 이후 줄곧 천시와 배척을 당하던 한국 무속의 역사와 실상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조선후기에 선교사와 국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의 무속을 샤머니즘의 일종으로 주목한 19세기말의 선교사들은 그 논의의 목적이 선교에 제한된 것이었고, 신채호·박은식·최남선 같은 국학 연구자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무속을 ‘신교(神敎)’와 ‘선교(仙敎)’ 등의 상이한 표현으로 일컬으며 한국의 고유종교로서 관심을 표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1927년 잡지 『계명(啓明)』에 발표된 이능화의 「조선무속고」는 한국 무속에 관한 무려 125종에 달하는 방대한 고(古)자료들을 발췌·정리했을 뿐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는 현지조사, 지역별 무속의 정리와 중국, 일본의 무속과의 비교연구까지 수행하여 한국 무속에 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로서 모습을 갖췄다.
역사·풍습·언어로 살펴보는 한국의 무속
「조선무속고」는 고대 이후의 자료를 시대별로 정리했다는 면에서 일차적으로 한국 무속에 대한 자료집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자료의 단순한 정리를 넘어, 각종 무속 관련 자료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또한 이능화는 무속을 배척하던 당대의 지배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매몰되기보다 한국의 무속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고증하면서 무속현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려는 학문적 의지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무풍과 신사’(19장)를 별도의 장으로 두어 지역별 무속을 정리했으며, 천연두에 걸렸을 때 행하는 굿의 절차(295면)나 출가하지 못하고 죽은 여자 귀신인 손각씨(孫閣氏) 관련 풍습(328면) 등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해 당시 선조들이 행하던 한국 무속의 실상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무속의 본질과 실체를 밝히는 데 한자와 우리말에 기초한 언어풀이 방식을 시도한 점 또한 독특하다. 가령 이능화는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하늘에 제사 지내는 설단제천(設壇祭天)에서 단군(壇君)이란 단어가 비롯됐다고 해석하며(93면), ‘궂은날’ ‘궂진일’로 활용되는 우리말의 용례에서 ‘굿’이란 용어가 ‘흉하다’는 의미(282면)를 지니게 되었다고 풀이한다.
꼼꼼한 원문 교감(矯監)을 거친 완역주석본
한·중·일의 무수한 자료를 섭렵하여 발췌·정리한 이능화의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조선무속고」 원본에는 원자료와 다른 오자(誤字)가 상당수 발견되거나 인용자료의 책명이 틀린 경우, 무관한 자료의 제시 등의 오류가 존재했었다. 기존에 출간된 완역본과 여러권의 부분 번역본들은 모두 이 잘못된 원문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역주자는 수년간 강의를 거치면서 원문을 꼼꼼히 대조하며 오자를 바로잡았고, 미확인된 자료를 재차 찾아 확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번역과 주석을 덧붙여 출간된 이번 완역주석본은 「조선무속고」의 유일한 정판본이라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 책은 우리 동아시아 담론의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취지로 서남학술재단에서 지원하는 서남동양학자료총서 시리즈로 간행되었다.
저자소개
저자 : 이능화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현(子賢), 호는 간정(侃亭)·상현(尙玄)·무능거사(無能居士)이다. 1869년(고종 6) 충청북도 괴산(塊山)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한학을 배웠으며, 1887년 이후 서울의 여러 학교에서 영어·중국어·프랑스어·일본어를 익혀 능통하게 구사하였다. 1895년 농상공부의 주사로 채용되었다가, 관립 외국어학교·관립한성법어학교(官立漢城法語學校) 등에 재직하였다.
1907년에는 일본을 시찰하고 국문연구소의 위원을 맡기도 하였다. 1912년 능인(能仁)보통학교를 세워 교장을 맡았으며, 1915년에 설립된 불교진흥회에도 참여하였다. 1922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통치 방안의 하나로 수행한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15년간 《조선사》 편찬사업에 종사하였다. 1930년에는 일본인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청구학회(靑丘學會)에 참여하였고, 1931년에는 박승빈(朴勝彬)·오세창(吳世昌) 등과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를 조직하여 민족계몽과 학술연구 활동을 하였다. 또 1940년에는 친일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종교서로 《조선불교통사》《조선신교원류고(朝鮮新敎源流考)》《조선기독교급외교사(朝鮮基督敎及外交史)》 《조선신화고(朝鮮神話考)》, 사상서로 《조선유교지양명학(朝鮮儒敎之陽明學)》 《조선유학급유학사상사(朝鮮儒學及儒學思想史)》가 있다. 또 풍속과 관련된 《조선상제예속사(朝鮮喪制禮俗事)》《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기생의 역사)《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가 있으며, 기타 《이조경성시제(李朝京城市制)》《조선십란록(朝鮮十亂錄)》《조선의약발달사》《조선도교사(朝鮮道敎史)》《조선사회사》 등이 있다.
활동한 시기로 볼 때 안확(安廓)과 더불어 계몽시대 사학자로 지칭되기도 한다. 또한 분류사(分類史)를 중심으로 그 나름대로 학문적인 세계를 개척했으나 전통적인 방법의 자료 수집과 정리에 치우치고, 특히 민족사에 대한 역사의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다.
역자 : 서영대
인하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조선무속고》(역서, 창비, 2008), 〈道與東方文化〉(공저, 중국 《宗敎文化出版社》, 2012), 〈무당내력 소재 단군기사의 검토〉(《민족문화논총》 59, 2015)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현(子賢), 호는 간정(侃亭)·상현(尙玄)·무능거사(無能居士)이다. 1869년(고종 6) 충청북도 괴산(塊山)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한학을 배웠으며, 1887년 이후 서울의 여러 학교에서 영어·중국어·프랑스어·일본어를 익혀 능통하게 구사하였다. 1895년 농상공부의 주사로 채용되었다가, 관립 외국어학교·관립한성법어학교(官立漢城法語學校) 등에 재직하였다.
1907년에는 일본을 시찰하고 국문연구소의 위원을 맡기도 하였다. 1912년 능인(能仁)보통학교를 세워 교장을 맡았으며, 1915년에 설립된 불교진흥회에도 참여하였다. 1922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통치 방안의 하나로 수행한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15년간 《조선사》 편찬사업에 종사하였다. 1930년에는 일본인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청구학회(靑丘學會)에 참여하였고, 1931년에는 박승빈(朴勝彬)·오세창(吳世昌) 등과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를 조직하여 민족계몽과 학술연구 활동을 하였다. 또 1940년에는 친일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종교서로 《조선불교통사》《조선신교원류고(朝鮮新敎源流考)》《조선기독교급외교사(朝鮮基督敎及外交史)》 《조선신화고(朝鮮神話考)》, 사상서로 《조선유교지양명학(朝鮮儒敎之陽明學)》 《조선유학급유학사상사(朝鮮儒學及儒學思想史)》가 있다. 또 풍속과 관련된 《조선상제예속사(朝鮮喪制禮俗事)》《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기생의 역사)《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가 있으며, 기타 《이조경성시제(李朝京城市制)》《조선십란록(朝鮮十亂錄)》《조선의약발달사》《조선도교사(朝鮮道敎史)》《조선사회사》 등이 있다.
활동한 시기로 볼 때 안확(安廓)과 더불어 계몽시대 사학자로 지칭되기도 한다. 또한 분류사(分類史)를 중심으로 그 나름대로 학문적인 세계를 개척했으나 전통적인 방법의 자료 수집과 정리에 치우치고, 특히 민족사에 대한 역사의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다.
역자 : 서영대
인하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조선무속고》(역서, 창비, 2008), 〈道與東方文化〉(공저, 중국 《宗敎文化出版社》, 2012), 〈무당내력 소재 단군기사의 검토〉(《민족문화논총》 59,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