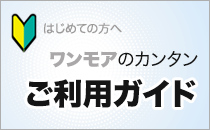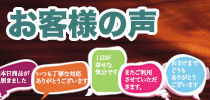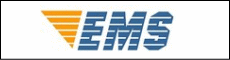[목 차]
1장 간절히 바라다
2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3장 그물에 걸리다
4장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
5장 탐하다
6장 그물이 찢어지다
7장 칼끝을 피해 달아나다
8장 살다
작가의 말
[본 문]
1) P.49~50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고 공랑의 얘기를 들은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제 발로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먼저 다가가면 바다 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린다고 했는데, 동글동글한 구슬로 살살 구슬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동글동글한 구슬을 좋아해요?”
“그것들은 결코 사람에게 잡히지 않아. 해파리처럼 은밀하고, 황새치보다 빠르니까. 사람이 다가가면 바다 속 깊은 곳으로 꽁꽁 숨어 버려.”
서 씨 할머니는 시조를 읊듯, 노래를 하듯 알 수 없는 말을 줄줄이 이어 갔다.
“하지만 새끼는 달라. 동글동글한 구슬이 달가닥달가닥 소리를 내면 사족을 못 쓰지. 자기 손으로 꼭 만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호기심 덩어리거든. 그날도 보름달 뜬 밤바다에 새끼가 떠올랐어. 휘영청 뜬 달을 보고 정신이 팔려 물 위로 머리통을 내밀었던 게지. 동그란 달을 만져 볼 욕심에 자기 목에 올가미가 걸리는 줄도 모르고...”
2) P.100~101
인어라니. 정말 인어를 잡았단 말인가. 덕무는 고래를 처음 보았을 때를 떠올렸다. 배보다 더 큰, 검고 거대한 머리통이 수면 위로 치솟아 올랐을 때, 덕무는 바다가 품은 생명의 경이로움에 고개를 숙였다.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함에,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움에, 유구한 시간 동안 스스로 살아온 생명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평생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어부로서 덕무는 바다가 정해 준 규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신비와 비밀을 품은 바다는 어부의 접근을 조금만 허락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부가 일평생 살기에 충분했다. 철 따라 명태, 오징어, 참치, 청어가 몰려왔다. 그것들이 물러가면 그다음에는 광어나 연어가 몰려왔다. 바다가 허락할 때 잡은 그것들은 살이 통통하게 올랐거나, 알을 가득 품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새끼 인어들을 잡아 배에 싣고 돌아가는 지금, 덕무는 바다가 금지한 것을 몰래 잡은 것 같아 속이 편치 않았다. 배 속에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불편하고 마음이 심란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이 되어 급히 도망가는 심정이었다. 이내 주인이 쫓아와 “이 도둑놈아. 내 것 내놔라!” 하고 호통을 치며 뒷덜미를 잡을 것 같았다. 엄습하는 죄책감을 쫓아내기 위해 소리 내어 중얼거렸다.
“영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약 만들어 주마. 얼른 먹고 살자, 내 딸 영실아.”
3) P.179~180
기름을 뜨기 전에 팔팔 달구어진 쇠 가마솥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몇 시간은 기다려야 가마솥이 식고 기름을 분리해서 뜰 수 있을 텐데 마을 사람 중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두런두런 이어지던 대화도 칼에 썰린 듯 뚝 끊겼다.
‘내 몫은 얼마나 될까?’
가마솥을 바라보는 모두의 머릿속은 똑같은 질문으로 꽉 차 있었다. 조 씨와 함께 인어 사냥에 나섰던 일행은 물론 사냥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뒤늦게나마 무엇 하나라도 거들며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려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마솥을 가져와 걸거나, 장작더미를 지고 오거나, 장작불을 지피거나 하면서 잔치라도 열 듯 부산을 떨었다.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였다. 저마다 오래 살아야 할 이유와 저간의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들을 통틀어 욕망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각자의 목숨은 소중했고 사정은 절실했다. 그 소중한 개개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어 기름을 원했다.
4) P.193
영실이 찔레에게 다가가려 하자 공 영감이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얘야, 냅둬라.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면 험한 꼴 보게 된다.”
멈춰 선 영실이 공 영감을 향해 말했다.
“영감님, 이보다 더 험한 꼴이 어디 있습니까? 영감님도 내 아부지도, 참 딱합니다. 사람처럼 생겨서, 사람처럼 먹고 사람처럼 말하는 걸 보고도 저 아이를 잡아먹겠다는 거요? 헉헉, 나더러도 잡아먹으라는 거요? 살기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사람은 나 살자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예요?”
덕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공 영감의 성난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귓가에 박혔다.
“아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물고기야! 사람 말 따라 하는 요망한 물고기라고! 네가 모르는 사이에 필경 인어에게 홀린 게야. 저 요물 때문에 제정신을 잃고 미친 거라고.”
“알았으니까 내 딸에게 소리 지르지 마소!”
덕무가 공 영감의 말을 끊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비가 마지막으로 말하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오늘 밤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러 오지 않으면 찔레를 잡아 기름을 내겠다.”
5) P.240~241
“네가 정녕 사실을 말하고 있느냐?”
영랑이 재차 확인하듯 물었다.
“네, 제가 어느 분 앞이라고 거짓을 말하겠습니까요? 못 믿겠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쇼.”
“다른 사람은 없다. 네가 유일한 생존자라 하지 않았느냐.”
“참, 그렇습죠.”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자꾸나.”
말고삐를 돌리려다 멈춘 영랑이 말했다.
“네 말대로 바다가 머리 위로 쏟아졌는데 너는 어찌 살아남았느냐?”
“...”
소년은 웃는 듯, 우는 듯 답이 없었다.
6) P.262~263
서복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서신에서 진시황에게 다음과 같이 고했다.
“봉래산의 불로장생약을 구할 수는 있으나, 바다 속에서 용 같은 물고기가 방해하여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불로장생약을 찾았지만 용이 버티고 있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반은 참이고 반은 거짓이었다. 용은 바다 속이 아닌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괴물이었다.